만약 내가 지금 시력을 잃으면? 아니면 청력을 잃으면?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또는 진로를 ‘장애’라는 것을 위해 바꿔야 할까?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위와 같은 생각을 품게 한 것은 이번 주 중 발표된 국제학술논문 중 눈에 띄는 논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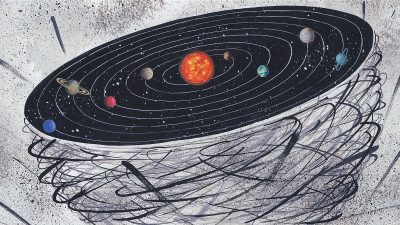
Inclusive astronomy in PERU: Contribution of Astronomyteaching forvisuallyimpairedpeople Alexis Rodriguez Quiroz, Kevin Vidal Cespedes 상의 논문은 AstroBVI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아래 노트 링크에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Inclusive astronomy in PERU: ContributionofAstronomyteachingforvisuallyimpairedpeoplewww.notion.so 논문의 핵심: 우리는, 그리고 천문학은 ‘빛’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많은 것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빛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천문학을 접할 수 있을까.천문학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현상을 모두에게 공유하려는 학문이다.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IAU(국제천문연맹)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인 AstroBVI 프로젝트(BVI: Blind and Visually Impaired)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리려는 논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교육매체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high-reliefimages :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습득 가능한 이미지 형태가 담긴 책 – Touch the Universe : NASA Braille Book of Astronomy (Noreen Grice, 2002) – Touch the Invisible Sky (Noreen Grice, Simon Steel & Doris Dau, 2007)
- 2.3D tactileimages : 책 표면에서는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천체의 구조와 표면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 3D 촉각 이미지 – The Tactile University of Portsmouth, UK) – 은하의 3D 프린팅 이미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Atouch of the university of Valencia) – 행성, 달, 별자리 등의 촉각 매체
- 3. ‘Lightsound’: Lightsound(Harvard University, IAU)는 2017년에는 미국, 2019년과 2020년에는 칠레에서 볼 수 있었던 일식 현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계였다. 라이트사운드가 밝기 변화를 감지하면 빛을 소리로 바꿔 소리를 내고, 빛이 강할 때 더 높은 소리 소리를 내고,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져 빛이 약해지면 소리가 낮아지는 방식이었다. (Allyson Bieryla, 2017)
4. NASA-Spooky Sounds from Across the Solar System: https://soundcloud.com/nasa/sets/spookyspacesoundsNASA이 제공하는 ‘우주의 소리’다. 전자파 형태의 빛을 소리(음파)로 변환해 공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AstroBVI’ 프로젝트는 2018년 IAU-OAD로부터 지원을 받은 칠레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칠레뿐만 아니라 주변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콜롬비아, 멕시코, 온두라스,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대중에게 촉각+감각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약 2년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수학 과학을 공부하고 접하는가. 그래서 직접 맹학교에 갔다. 복지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직접 시각장애를 가진 중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정말 어려웠다.숫자 계산과 식 계산은 어느 정도 끈기 있게 풀 수 있고 기계식 점자판이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머릿속으로 해결해야 했고 내가 만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문제 하나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 그러다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말로 설명하거나 빈 종이에 학생의 손을 잡고 그려보고 학생이 그리면 맞는지 체크하는 정도가 최선이었고 준비된 모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됐겠지만 문제집에 나온 모든 그림 모형이 있을 리 없었다.무엇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않았고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없이 수업도 6개월여 만에 끝냈고 내 호기심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과학 수화’처럼 ‘과학 점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가 적으면 글씨를 쓰는 일도 적고, 특히 수화라면 시각적 요소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점자는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수학 또는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나름대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어했던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임용시험까지 마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보았다.
선생님, 혹시 학창시절에 과학이나 수학 수업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배웠나요? 배워본 적 있어요? 과학에 관한 호기심은 있었나요?
선생님: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대체로 어려워해.어려운 이유는 계산할 때 연산과정을 쓰면서 문제풀이 불편하거나 귀찮아 암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교과정에서의 복잡한 수식을 일일이 암산하기가 쉽지 않아 수능까지 수학을 따는 아이는 드물다. 내 경우도 수학1공부할때 줄, 계단수열 등의 문제를 풀때 암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 그래프, 도형, 특히 입체도형을 점자 교과서에 점자로 그려져 있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아이가 적다는 것.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각각의 그래프나 도형을 처음 접했을 때 교사가 시각장애 학생에게 거의 1:1로 시각장애 학생의 손을 교사가 잡고 점자책에 그림을 만지고 느끼게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야 조금씩 점자 그림을 만지고 파악해 나가는 능력이 길러지는데 학교 수업시간에 거의 1:1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점자 그래프나 도형을 만지고 파악하는 능력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과외나 수업을 해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일일이 1:1 교육을 해주더라~입체도형의 경우는 처음 점자 그림만 만져서는 개념을 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입체도형에 해당하는 상자 등을 펼치거나 붙여 입체도형의 전개도 개념을 정하고 있었다. 입체도형은 점자 그림만 만져서는 입체감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는 실제 모형을 들고 강사가 시각장애 학생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실제 모형을 만지게 하면서 점자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이다.
선생님: 나는 수능 준비를 할 때 수학과 과학 과목이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했어! 과학의 여러 영역 중에서는 물리가 제일 좋아서 잘했어! 물론 고등학교 공통과학 수준의 물리이긴 했지만…시각장애 학생들도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꽤 있지만 위와 같은 현실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각 개념에 대한 학습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포기하게 된다!
그럼 점자로 1:1 연습을 같이 한 선생님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점자에 대해 익숙한 편이었나요?
선생님:아니!강사가점자를아는건아니지만일단강사가보고있는일반문자(시각장애인학교에서는점자와구분해서가리키기위해서묵자책을보고있기때문에그래프나도형의내용을알고있고점자책에그래프나도형이잘그려져있다면점자그래프나도형의모양을눈으로보고확인할수있기때문에시각장애학생의손을잡고점자책그래프나도형에따라설명할수있는것이다! 강사 자신이 보고 있는 묵자책 그래프나 도형을 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이과 영역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프나 도형 등을 점자로 만지며 인지하는 것에 대해 기초적인 것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훨씬 이과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렸지만 실제로 학회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천문학자가 있는지 찾아봤다.두 사람 정도 언급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완다 디아즈 메르세드라는 천문학자로 연구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잃은 후천적인 경우였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나를 향해 물은 질문에 그녀의 사례로 대답할 수 있다.Wanda Diaz Merced studies the light emitted by gamma-ray bursts, the most energetic events in the universe. When she lost her sight and was left without a way to do her science, she had a revelatory insight:the light curves she could no longer see could be translated into sound. Throughsonificatio…www.ted.com물론 그녀가 시력을 잃기 전에 가던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신호를 소리로 바꾸고 연구하는 분야(Sonification;데이터를 소리로 바꾸기)으로 바꾸어 연구를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리만 듣고 연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니 연구에도 귀천이 없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됐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천문대에서 일하며 맹학교 학생들의 천문학 공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멋지잖아! 아무리 은하와 시뮬레이션과 블랙홀과 외계행성에 관한 어려운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정말 멋진 천문학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Inclusive astronomy in PERU: Contribution of Astronomyteaching forvisuallyimpairedpeople Alexis Rodriguez Quiroz, Kevin Vidal Cespedes 상의 논문은 AstroBVI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아래 노트 링크에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Inclusive astronomy in PERU: ContributionofAstronomyteachingforvisuallyimpairedpeoplewww.notion.so 논문의 핵심: 우리는, 그리고 천문학은 ‘빛’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많은 것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빛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천문학을 접할 수 있을까.천문학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현상을 모두에게 공유하려는 학문이다.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IAU(국제천문연맹)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인 AstroBVI 프로젝트(BVI: Blind and Visually Impaired)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리려는 논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교육매체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high-reliefimages :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습득 가능한 이미지 형태가 담긴 책 – Touch the Universe : NASA Braille Book of Astronomy (Noreen Grice, 2002) – Touch the Invisible Sky (Noreen Grice, Simon Steel & Doris Dau, 2007)
- 2.3D tactileimages : 책 표면에서는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천체의 구조와 표면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 3D 촉각 이미지 – The Tactile University of Portsmouth, UK) – 은하의 3D 프린팅 이미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Atouch of the university of Valencia) – 행성, 달, 별자리 등의 촉각 매체
- 3. ‘Lightsound’: Lightsound(Harvard University, IAU)는 2017년에는 미국, 2019년과 2020년에는 칠레에서 볼 수 있었던 일식 현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계였다. 라이트사운드가 밝기 변화를 감지하면 빛을 소리로 바꿔 소리를 내고, 빛이 강할 때 더 높은 소리 소리를 내고,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져 빛이 약해지면 소리가 낮아지는 방식이었다. (Allyson Bieryla, 2017)
4. NASA-Spooky Sounds from Across the Solar System: https://soundcloud.com/nasa/sets/spookyspacesoundsNASA이 제공하는 ‘우주의 소리’다. 전자파 형태의 빛을 소리(음파)로 변환해 공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AstroBVI’ 프로젝트는 2018년 IAU-OAD로부터 지원을 받은 칠레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칠레뿐만 아니라 주변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콜롬비아, 멕시코, 온두라스,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대중에게 촉각+감각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약 2년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수학 과학을 공부하고 접하는가. 그래서 직접 맹학교에 갔다. 복지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직접 시각장애를 가진 중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정말 어려웠다.숫자 계산과 식 계산은 어느 정도 끈기 있게 풀 수 있고 기계식 점자판이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머릿속으로 해결해야 했고 내가 만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문제 하나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 그러다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말로 설명하거나 빈 종이에 학생의 손을 잡고 그려보고 학생이 그리면 맞는지 체크하는 정도가 최선이었고 준비된 모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됐겠지만 문제집에 나온 모든 그림 모형이 있을 리 없었다.무엇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않았고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없이 수업도 6개월여 만에 끝냈고 내 호기심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과학 수화’처럼 ‘과학 점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가 적으면 글씨를 쓰는 일도 적고, 특히 수화라면 시각적 요소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점자는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수학 또는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나름대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어했던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임용시험까지 마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보았다.
선생님, 혹시 학창시절에 과학이나 수학 수업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배웠나요? 배워본 적 있어요? 과학에 관한 호기심은 있었나요?
선생님: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대체로 어려워해.어려운 이유는 계산할 때 연산과정을 쓰면서 문제풀이 불편하거나 귀찮아 암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교과정에서의 복잡한 수식을 일일이 암산하기가 쉽지 않아 수능까지 수학을 따는 아이는 드물다. 내 경우도 수학1공부할때 줄, 계단수열 등의 문제를 풀때 암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 그래프, 도형, 특히 입체도형을 점자 교과서에 점자로 그려져 있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아이가 적다는 것.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각각의 그래프나 도형을 처음 접했을 때 교사가 시각장애 학생에게 거의 1:1로 시각장애 학생의 손을 교사가 잡고 점자책에 그림을 만지고 느끼게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야 조금씩 점자 그림을 만지고 파악해 나가는 능력이 길러지는데 학교 수업시간에 거의 1:1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점자 그래프나 도형을 만지고 파악하는 능력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과외나 수업을 해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일일이 1:1 교육을 해주더라~입체도형의 경우는 처음 점자 그림만 만져서는 개념을 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입체도형에 해당하는 상자 등을 펼치거나 붙여 입체도형의 전개도 개념을 정하고 있었다. 입체도형은 점자 그림만 만져서는 입체감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는 실제 모형을 들고 강사가 시각장애 학생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실제 모형을 만지게 하면서 점자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이다.
선생님: 나는 수능 준비를 할 때 수학과 과학 과목이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했어! 과학의 여러 영역 중에서는 물리가 제일 좋아서 잘했어! 물론 고등학교 공통과학 수준의 물리이긴 했지만…시각장애 학생들도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꽤 있지만 위와 같은 현실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각 개념에 대한 학습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포기하게 된다!
그럼 점자로 1:1 연습을 같이 한 선생님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점자에 대해 익숙한 편이었나요?
선생님:아니!강사가점자를아는건아니지만일단강사가보고있는일반문자(시각장애인학교에서는점자와구분해서가리키기위해서묵자책을보고있기때문에그래프나도형의내용을알고있고점자책에그래프나도형이잘그려져있다면점자그래프나도형의모양을눈으로보고확인할수있기때문에시각장애학생의손을잡고점자책그래프나도형에따라설명할수있는것이다! 강사 자신이 보고 있는 묵자책 그래프나 도형을 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이과 영역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프나 도형 등을 점자로 만지며 인지하는 것에 대해 기초적인 것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훨씬 이과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렸지만 실제로 학회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천문학자가 있는지 찾아봤다.두 사람 정도 언급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완다 디아즈 메르세드라는 천문학자로 연구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잃은 후천적인 경우였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나를 향해 물은 질문에 그녀의 사례로 대답할 수 있다.Wanda Diaz Merced studies the light emitted by gamma-ray bursts, the most energetic events in the universe. When she lost her sight and was left without a way to do her science, she had a revelatory insight:the light curves she could no longer see could be translated into sound. Throughsonificatio…www.ted.com물론 그녀가 시력을 잃기 전에 가던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신호를 소리로 바꾸고 연구하는 분야(Sonification;데이터를 소리로 바꾸기)으로 바꾸어 연구를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리만 듣고 연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니 연구에도 귀천이 없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됐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천문대에서 일하며 맹학교 학생들의 천문학 공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멋지잖아! 아무리 은하와 시뮬레이션과 블랙홀과 외계행성에 관한 어려운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정말 멋진 천문학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TED 내용 중 과학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면서 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은가?
이번에는 Nicolas Bonne이라는 저시력 장애를 가진 천문학자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는 천문학자의 길거리에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이미지를 명확히 본 적이 없는 천문학자라는 것이 위에서 언급된 천문학자와 다른 점이다. 그의 이름을 유튜브로 검색하면 관련 영상도 많이 나오고, 택틸유니버스(직역하면 ‘촉각우주’)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는 영상도 많다. 그가 어떻게 그래프를 읽고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약 1년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열정과 자신감이 명확하고 맑아 기억에 많이 남았다.
NicBonne 관련 YouTube 영상 Weusecookies andothertechnologiestocollect dataaboutyouse ofoursite and aboutyousee onthis and location. Weprocessthis datahelpusunderstandhowthesiteisused and to personalize ourcontent and the databoutyouse of orsite and location. Weusecookies understanderstandhowthes understandhowthes orderstandhowthes an derst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다.우리만의 학문이 아니다.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에 올라온 과학수화(행성, 천체 등을 수화로 표현한-아래 과천과학관 유튜브 링크 참조)를 비롯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라온 한국천문연구원의 청각장애인 관련 영상도 의미가 컸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광대한 다양성을 가진 우주를 연구하는 것을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더 아름다운 학문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m.youtube.com